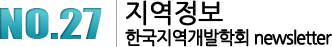다른 웹진 보기
권두언
지방자치제도 개편의 의의
김현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952년 정부는 시·도 의원과 시·읍·면 의원을 선출해 지방의회를 구성했다. 그 후 우여곡절 끝에 1991년 4월 폐지되었던 지방의회가 부활되었고, 2020년 말 1988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우리는 과거 오백년 이상 동안 중앙집권적 국가였다. 그 경험은 유별났으며 국가 정책 결정의 거의 모든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거의 설 자리가 없이 배제되었다. 우리는 주한 미 대사를 지낸 그레고리 핸더슨(Gregory Henderson)이 언급한 중앙 정치 권력의 블랙홀을 유발하기도 했다. 그 결과는 우울한 것이었다. 중앙에 의해 국가의 재원과 거의 모든 시책이 결정되고 예산이 배분되다 보니, 권력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 부를 포함해서 지역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의 배분도 그리 바람직한 것이 되지 못했다.
폐해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본디 정책은 삶의 현장에 부합할 때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것이 정석. 그런데 우리는 그 길과 다른 길을 걸었다. 그러고 그것은 정책결정에 대한 현지의 참여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되어야 담보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중앙정부가 대충 디자인해서 전국에 획일적으로 만들어 제공하는 정책을 지방정부가 수동적으로 추진했다, 자기 몸에 맞지도 않는 옷을 입는 격이었다.
물론 국가의 ‘축적 기능’과 ‘정당화 기능’ 가운데 축적 기능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중앙집권의 역사가 너무 길었고, 또 깊었음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 중앙집권의 폐해가 너무 많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정책 결정에 대한 구성원의 참여는 물론이고,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 대립형으로만 지방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기관구성 형태에서부터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까지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여러 부분에서 제약되었다.
하지만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 이런 부분이 해소되고 있다. 특히 주민의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의회의 독립성 등이 신장되고 있다. 물론 자치입법권, 자치 조직권, 자치 재정권 등에서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에 견주어 미흡한 부문이 적지 않은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 이처럼 지방자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특히 지금은 인공지능, 알고리즘, 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전환의 시대이다. 무엇보다 데이터에 대한 권리, 지역의 발전에 대한 권리, 정책에 대한 권리 등으로 삶의 현장에 대한 보다 높은 자기 결정권을 요구할 것이다.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향후 부족한 사항은 점차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점은 궁극적으로 지방정부의 의사 결정권이 더욱 높아지는 “자치 국가,” “분권 국가”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과거 오백년 이상 동안 중앙집권적 국가였다. 그 경험은 유별났으며 국가 정책 결정의 거의 모든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거의 설 자리가 없이 배제되었다. 우리는 주한 미 대사를 지낸 그레고리 핸더슨(Gregory Henderson)이 언급한 중앙 정치 권력의 블랙홀을 유발하기도 했다. 그 결과는 우울한 것이었다. 중앙에 의해 국가의 재원과 거의 모든 시책이 결정되고 예산이 배분되다 보니, 권력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 부를 포함해서 지역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의 배분도 그리 바람직한 것이 되지 못했다.
폐해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본디 정책은 삶의 현장에 부합할 때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것이 정석. 그런데 우리는 그 길과 다른 길을 걸었다. 그러고 그것은 정책결정에 대한 현지의 참여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되어야 담보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중앙정부가 대충 디자인해서 전국에 획일적으로 만들어 제공하는 정책을 지방정부가 수동적으로 추진했다, 자기 몸에 맞지도 않는 옷을 입는 격이었다.
물론 국가의 ‘축적 기능’과 ‘정당화 기능’ 가운데 축적 기능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중앙집권의 역사가 너무 길었고, 또 깊었음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 중앙집권의 폐해가 너무 많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정책 결정에 대한 구성원의 참여는 물론이고,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 대립형으로만 지방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기관구성 형태에서부터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까지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여러 부분에서 제약되었다.
하지만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 이런 부분이 해소되고 있다. 특히 주민의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의회의 독립성 등이 신장되고 있다. 물론 자치입법권, 자치 조직권, 자치 재정권 등에서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에 견주어 미흡한 부문이 적지 않은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 이처럼 지방자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특히 지금은 인공지능, 알고리즘, 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전환의 시대이다. 무엇보다 데이터에 대한 권리, 지역의 발전에 대한 권리, 정책에 대한 권리 등으로 삶의 현장에 대한 보다 높은 자기 결정권을 요구할 것이다.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향후 부족한 사항은 점차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점은 궁극적으로 지방정부의 의사 결정권이 더욱 높아지는 “자치 국가,” “분권 국가”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