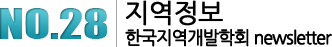다른 웹진 보기
이슈와 쟁점
청년 참여, 주류를 넘어 다양성을 향해
김지윤(국무총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한민국은 이른바 ‘대청년시대’를 맞이했다. 정치권, 기업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에서 청년의 중요성, 청년의 필요성을 외치며 청년에게 러브콜을 보내기에 여념이 없다.
사실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X세대, Y세대에서 MZ세대로 수식어만 달라졌을 뿐, 대한민국에서 청년은 언제나 시대의 주인공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2021년의 청년이 새삼 특별한 이유는 청년이 이전처럼 주목받는 ‘대상’이 아닌 삶을 결정하는 ‘주체’로 나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청년기본법의 제정, 정부 및 지자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위원 50% 위촉, 헌정사 최연소 30대 당 대표 선출, 20대 청년비서관 임명 등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청년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가히 고무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를 자축하기에 앞서, 나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청년’은 어떤 모습인가?
나는 18살, 고등학교 2학년의 나이로 처음 참여 거버넌스 활동을 시작했다.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해 지원했던 여느 대외활동 같았던 그곳에서 나는 자신을 ‘학교밖 청소년’이라고 소개하는 친구를 만났다. 그 친구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고, 목공을 배워 사회적 기업가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나는 놀라웠다. 청소년이 학생이 아닐 수도 있구나. 평생 초-중-고의 전형적인 코스를 밟고 살았던 내게 그 충격은 세상이 반으로 쪼개지는 듯했다. 청소년이 학생이 아닐 수도 있었어. ‘위대한 개츠비’ 속 닉의 아버지가 왜 그런 충고를 했는지 알 수 있게 된 순간이었다.
청년이 되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세상에는 나와는 다른, 너무나도 다른 환경과 삶 속에서 살아온 청년들이 있었다. 우리는 함께 대화했고, 함께 ‘청년’ 정책을 만들었다.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활동해오면서, 나는 ‘아 그래도 난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구나’라는 뿌듯함에 젖어있었다. 그러던 중, 함께 활동했던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이유도, ‘먹고 살만해서’가 아니겠어?”
그게 아니라면, 이 금요일에 서울까지 올라와 하루를 온전히 대외활동 하나만을 위해 쓸 수 있었겠냐고. 학업을 위해, 생계를 위해 일해야만 하는 청년이라면 이 평일에 시간을 쓸 수 있었겠냐고. 나는 깨달았다. 5년 동안 몸담았던 청소년 참여기구에서 나는 한 번도 위기청소년을 본 적이 없다. 보호종료 아동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나서야 나는 ‘보호종료 아동’의 존재를 알았다. 정책의 수요자가 직접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장소에 어떠한 이들은 보이지 않는다. 거버넌스가 이럴진대, 정부위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대부분 그들의 생존과 삶과 연결되어 있다. 어쩌면 더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게 할 자리에 나가는데, 삶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청년 정치. 청년 참여. 나는 청년의 참여가 비단 전형적인 삶 속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세상에 살고 있고, 그에 대한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치를 배분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함께 논의해야 할 이들 중 누군가가 공론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동료 시민이 그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한다. 그 어느 세대 중에서도 내부적으로 파편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청년을 위한 정치라면, 청년 참여라면 더더욱 그래야만 한다. ‘먹고 살 만’하지 못한 이들을 호명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청년 참여, 주류를 넘어 다양성을 향해 나설 때이다.
사실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X세대, Y세대에서 MZ세대로 수식어만 달라졌을 뿐, 대한민국에서 청년은 언제나 시대의 주인공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2021년의 청년이 새삼 특별한 이유는 청년이 이전처럼 주목받는 ‘대상’이 아닌 삶을 결정하는 ‘주체’로 나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청년기본법의 제정, 정부 및 지자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위원 50% 위촉, 헌정사 최연소 30대 당 대표 선출, 20대 청년비서관 임명 등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청년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가히 고무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를 자축하기에 앞서, 나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청년’은 어떤 모습인가?
나는 18살, 고등학교 2학년의 나이로 처음 참여 거버넌스 활동을 시작했다.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해 지원했던 여느 대외활동 같았던 그곳에서 나는 자신을 ‘학교밖 청소년’이라고 소개하는 친구를 만났다. 그 친구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고, 목공을 배워 사회적 기업가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나는 놀라웠다. 청소년이 학생이 아닐 수도 있구나. 평생 초-중-고의 전형적인 코스를 밟고 살았던 내게 그 충격은 세상이 반으로 쪼개지는 듯했다. 청소년이 학생이 아닐 수도 있었어. ‘위대한 개츠비’ 속 닉의 아버지가 왜 그런 충고를 했는지 알 수 있게 된 순간이었다.
청년이 되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세상에는 나와는 다른, 너무나도 다른 환경과 삶 속에서 살아온 청년들이 있었다. 우리는 함께 대화했고, 함께 ‘청년’ 정책을 만들었다.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활동해오면서, 나는 ‘아 그래도 난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구나’라는 뿌듯함에 젖어있었다. 그러던 중, 함께 활동했던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이유도, ‘먹고 살만해서’가 아니겠어?”
그게 아니라면, 이 금요일에 서울까지 올라와 하루를 온전히 대외활동 하나만을 위해 쓸 수 있었겠냐고. 학업을 위해, 생계를 위해 일해야만 하는 청년이라면 이 평일에 시간을 쓸 수 있었겠냐고. 나는 깨달았다. 5년 동안 몸담았던 청소년 참여기구에서 나는 한 번도 위기청소년을 본 적이 없다. 보호종료 아동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나서야 나는 ‘보호종료 아동’의 존재를 알았다. 정책의 수요자가 직접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장소에 어떠한 이들은 보이지 않는다. 거버넌스가 이럴진대, 정부위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대부분 그들의 생존과 삶과 연결되어 있다. 어쩌면 더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게 할 자리에 나가는데, 삶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청년 정치. 청년 참여. 나는 청년의 참여가 비단 전형적인 삶 속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세상에 살고 있고, 그에 대한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치를 배분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함께 논의해야 할 이들 중 누군가가 공론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동료 시민이 그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한다. 그 어느 세대 중에서도 내부적으로 파편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청년을 위한 정치라면, 청년 참여라면 더더욱 그래야만 한다. ‘먹고 살 만’하지 못한 이들을 호명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청년 참여, 주류를 넘어 다양성을 향해 나설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