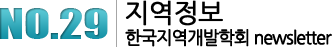다른 웹진 보기
자유기고
송도신도시의 회고와 전망을 통한 지능형 도시 추진 방향 제언
구한민(연세대학교 스마트시티융합서비스연구개발단 연구원)

유시티와 스마트시티
현재 도시계획의 최고 화두는 스마트시티(smart city)다. 스마트시티는 바람직한 도시의 미래상 중 하나로,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보편적으로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을 도시의 서비스와 기반시설에 접목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도시”1)로 이해할 수 있다. 당초 스마트시티는 도시의 지능화 개념에서 시작하였다.2) 지능형 도시는 세계적으로 연원이 깊으나,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유시티(Ubiquitous City, U-City)의 형태로 처음 등장하였고, 2008년에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비쿼터스도시법)을 제정·시행하며 본격 추진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스마트시티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2017년 유비쿼터스도시법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로 개정하면서부터였다.
송도 유시티의 성과와 한계
이와 별개로 인천시는 일찍부터 송도에서 미래도시 조성을 추진하여 왔다. 이미 1986년부터 송도정보화신도시 조성계획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1999년에는 최종 기본구상안을 확정하여 건설을 시작하였다. 2003년에는 송도신도시 전체가 인천경제자유구역(Incheon Free Economic Zone, IFEZ)으로 지정되면서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가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송도 유시티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2003년 정부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 육성’이라는 비전하에 대규모의 최첨단 유비쿼터스 환경을 구축을 목표로 하였으며, IFEZ의 IT(Information Technology), BT(Bio Technology), NT(Nano Technology) 산업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이 설정되었다.3) 2003~2009년은 유시티 도입기로 유비쿼터스 환경 구현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집중하였으며, 2010~2016년은 유시티 구축기로 관제센터를 설치하고 관련한 서비스를 확대하였다.4)
송도 유시티의 출발은 창대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목표한 만큼의 성과를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우선 성과라면 우리나라 최초의 유시티로서 단기간에 상당한 인프라를 구축하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자체적인 플랫폼과 관련 신기술을 개발하여 국제적인 공신력을 확보하여 유시티 개발 모델을 수출하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하지만 서비스의 발전이 지속되지 못하고 인프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지속가능성이 낮았다는 점, 첨단 기술에만 주목한 나머지 도시적 맥락(urban context)과 이용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 정부 주도의 국책사업 형태로 수행되는 과정에서 민간의 역할이 도외시되었다는 점 등 노정된 한계가 더욱 크게 부각되었다.
송도 스마트시티의 전망
2017년 송도 유시티는 전기를 맞이한다. 우리나라 지능형 도시의 패러다임(paradigm)이 유시티에서 스마트시티로 변화하였고, 유비쿼터스도시법이 스마트도시법으로 개정되는 등 법제상의 정비도 이루어졌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Global Leading Smart City, IFEZ’라는 새로운 슬로건 아래 스마트시티 3S(Space, System, Service) 통합 전략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지구별 별도로 구축 운영토록 한 운영센터를 하나의 센터로 합치고(Space 통합), 분산되어있는 IT자원을 하나로 통합하며(System 통합),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Service 통합) 비용의 절감과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다.5) 이중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Space 통합 부문이다. 2017년 4월부터 IFEZ 스마트시티 운영센터는 통합 운영되고 있다. 해당 센터에서는 송도·청라·영종 등 IFEZ 전체를 하나의 통신망으로 연결함으로써 행정, 교통, 방범, 방재, 환경 등 개별 서비스를 상호연계하여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들이 연간 600여 건의 크고 작은 사건, 사고를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비단 첨단이 아니더라도 간단한 기술을 통하여 실제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서비스는 진정으로 똑똑한 도시, 스마트시티가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제시하여 준다.
지능형 도시 추진 방향 제언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며 지능형 도시의 개념과 역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언제 스마트시티를 잇는 새로운 지능형 도시의 패러다임이 새롭게 등장할지 알 수 없다. 그럼에도 유시티와 스마트시티의 골자는 유지될 것이므로 우리나라 최초의 미래도시로 계획되고, 추진되었던 송도신도시의 교훈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필자는 송도 유시티의 회고, 송도 스마트시티의 전망을 통한 지능형 도시의 성공적인 추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스마트시티의 방점을 스마트에 앞서 ‘시티’에 찍어야 한다. 스마트에만 초점을 맞추어 백화점식 나열한 서비스를 경쟁하는 것보다, 도시의 장소성(placeness)을 반영하여 ‘곳’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둘째, ‘스마트’를 최첨단(cutting-edge), 특히 최첨단 기술과 동의어라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도입 당시에는 획기적인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였던 송도신도시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현재 악취를 유발하고 세금을 좀먹는 ‘예쁜 쓰레기’로 취급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자. 셋째, 지능형 도시 서비스의 지속적인 혁신과 산업 발전을 위하여서는 민간의 역할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혁신과 성장은 기업가의 몫이라는 슘페터의 지적6)은 민간기업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덴마크 코펜하겐(Copenhagen), 미국 댈러스(Dallas) 등의 해외 스마트시티 사례로 보아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시계획의 최고 화두는 스마트시티(smart city)다. 스마트시티는 바람직한 도시의 미래상 중 하나로,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보편적으로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을 도시의 서비스와 기반시설에 접목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도시”1)로 이해할 수 있다. 당초 스마트시티는 도시의 지능화 개념에서 시작하였다.2) 지능형 도시는 세계적으로 연원이 깊으나,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유시티(Ubiquitous City, U-City)의 형태로 처음 등장하였고, 2008년에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비쿼터스도시법)을 제정·시행하며 본격 추진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스마트시티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2017년 유비쿼터스도시법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로 개정하면서부터였다.
송도 유시티의 성과와 한계
이와 별개로 인천시는 일찍부터 송도에서 미래도시 조성을 추진하여 왔다. 이미 1986년부터 송도정보화신도시 조성계획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1999년에는 최종 기본구상안을 확정하여 건설을 시작하였다. 2003년에는 송도신도시 전체가 인천경제자유구역(Incheon Free Economic Zone, IFEZ)으로 지정되면서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가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송도 유시티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2003년 정부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 육성’이라는 비전하에 대규모의 최첨단 유비쿼터스 환경을 구축을 목표로 하였으며, IFEZ의 IT(Information Technology), BT(Bio Technology), NT(Nano Technology) 산업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이 설정되었다.3) 2003~2009년은 유시티 도입기로 유비쿼터스 환경 구현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집중하였으며, 2010~2016년은 유시티 구축기로 관제센터를 설치하고 관련한 서비스를 확대하였다.4)
송도 유시티의 출발은 창대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목표한 만큼의 성과를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우선 성과라면 우리나라 최초의 유시티로서 단기간에 상당한 인프라를 구축하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자체적인 플랫폼과 관련 신기술을 개발하여 국제적인 공신력을 확보하여 유시티 개발 모델을 수출하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하지만 서비스의 발전이 지속되지 못하고 인프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지속가능성이 낮았다는 점, 첨단 기술에만 주목한 나머지 도시적 맥락(urban context)과 이용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 정부 주도의 국책사업 형태로 수행되는 과정에서 민간의 역할이 도외시되었다는 점 등 노정된 한계가 더욱 크게 부각되었다.
송도 스마트시티의 전망
2017년 송도 유시티는 전기를 맞이한다. 우리나라 지능형 도시의 패러다임(paradigm)이 유시티에서 스마트시티로 변화하였고, 유비쿼터스도시법이 스마트도시법으로 개정되는 등 법제상의 정비도 이루어졌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Global Leading Smart City, IFEZ’라는 새로운 슬로건 아래 스마트시티 3S(Space, System, Service) 통합 전략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지구별 별도로 구축 운영토록 한 운영센터를 하나의 센터로 합치고(Space 통합), 분산되어있는 IT자원을 하나로 통합하며(System 통합),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Service 통합) 비용의 절감과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다.5) 이중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Space 통합 부문이다. 2017년 4월부터 IFEZ 스마트시티 운영센터는 통합 운영되고 있다. 해당 센터에서는 송도·청라·영종 등 IFEZ 전체를 하나의 통신망으로 연결함으로써 행정, 교통, 방범, 방재, 환경 등 개별 서비스를 상호연계하여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들이 연간 600여 건의 크고 작은 사건, 사고를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비단 첨단이 아니더라도 간단한 기술을 통하여 실제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서비스는 진정으로 똑똑한 도시, 스마트시티가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제시하여 준다.
지능형 도시 추진 방향 제언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며 지능형 도시의 개념과 역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언제 스마트시티를 잇는 새로운 지능형 도시의 패러다임이 새롭게 등장할지 알 수 없다. 그럼에도 유시티와 스마트시티의 골자는 유지될 것이므로 우리나라 최초의 미래도시로 계획되고, 추진되었던 송도신도시의 교훈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필자는 송도 유시티의 회고, 송도 스마트시티의 전망을 통한 지능형 도시의 성공적인 추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스마트시티의 방점을 스마트에 앞서 ‘시티’에 찍어야 한다. 스마트에만 초점을 맞추어 백화점식 나열한 서비스를 경쟁하는 것보다, 도시의 장소성(placeness)을 반영하여 ‘곳’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둘째, ‘스마트’를 최첨단(cutting-edge), 특히 최첨단 기술과 동의어라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도입 당시에는 획기적인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였던 송도신도시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현재 악취를 유발하고 세금을 좀먹는 ‘예쁜 쓰레기’로 취급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자. 셋째, 지능형 도시 서비스의 지속적인 혁신과 산업 발전을 위하여서는 민간의 역할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혁신과 성장은 기업가의 몫이라는 슘페터의 지적6)은 민간기업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덴마크 코펜하겐(Copenhagen), 미국 댈러스(Dallas) 등의 해외 스마트시티 사례로 보아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정의하고 있다.
- Deakin, M. (Ed.). (2013). Smart Cities: Governing, Modelling and Analysing the Transition. Routledge.
- 최병남, 김영표, 김동한, 임은선, 한선희. (2005). 「時空自在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Ⅱ): 時空自在도시 구현방안」. 국토연구원.
- 손혜정. (2018). 인천경제자유구역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과 과제. 「한국건설관리 학회지」, 19(2), 41-45.
- 상게문헌
- Schumpeter, J. (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Harvard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