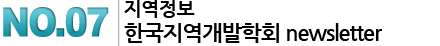다른 웹진 보기
국내 외 지역개발 사례
기후변화와 지역차원의 대응방안
왕광익 박사(국토연구원 연구위원)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 총회(COP21)에서 2020년 이후의 지구온난화대책의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인 “파리협정”이 정식으로 채택되었다. 세계 공통의 장기적인 목표로 금세기 후반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거의 제로로 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앞으로 모든 국가와 지역에서 온실가스 사회구조를 벗어나기 위한 脫탄소형사회로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산화탄소로 대표되는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특히, 지난해 말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新기후체제가 2020년 이후부터 적용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하며, 지역차원에서 더욱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과 피해가 구체적으로 가시화되는 공간은 지역이며,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국가 단위로 주어지더라도 기후변화 대책의 중요한 집행 주체는 바로 지방자치단체이다. 따라서 지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의 적극적인 행동과 참여가 중요하다(Think Globally, Act Locally). 또한 국가차원의 노력은 국제정치의 틀에서 자국이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에 보다 시급한 실천적 노력이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이에 지역 차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방안 모색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저탄소 녹색도시의 구축이 실질적이며 가장 빠른 기후변화 대응의 지름길일 것이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들은 소개하고자 한다. 세계 각국이 지역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을 크게 ① 도시기능 집약화, ② 대중교통 활성화, ③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측면, ④ 녹지의 보전과 확충측면, ⑤ 신재생에너지 측면 등 5가지 측면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는 도시공간구조 측면에서 도시기능을 집약화를 통한 직주근접과 기반시설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효율화 대책이다. 일본 아오모리시(青森市)는 콤팩트 시티 정책을 통한 교외의 자연 환경 보전을 추진하고 있다. 콤팩트 시티를 형성하는 도시 구조를 기본적으로 계획하고, ‘Inner’, ‘Mid’, ‘Out’의 3개 권역으로 공간을 구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도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의 사례로 2001년 아오모리역에 시민 도서관과 시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을 포함한 상업 시설을 오픈 하였다. 교외의 자연 환경 보전을 위해 시가지를 둘러싼 교외에는 귀중한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너도밤나무심기 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동시에 무질서한 교외개발을 억제하고 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Strasbourg)는 시내 중심에 보행자 구역을 설치하여, 세계유산으로 등록 된 도시의 중심에서 순환 도로 안쪽을 보행자 구역으로 자동차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노면전차로 트램을 도입하여 트램과 버스의 연계를 배려하고 운임을 단일화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스트라스부르의 운행 경비 중 운임을 통한 수입은 약 60 % 정도이고 나머지는 교통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스트라스부르 도시공동체 (CUS, Communauté Urbaine de Strasbourg)에서 보조하고 있다. 영국 런던은 걸어서 살 수 있는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시가지의 고밀화에 따라 교외지역을 재정비하고 교외지역의 역이나 상가 주변을 재생하고 걷고 생활 할 수 있는 도시로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센터(교외 1,500 개소)의 도보 권에 고밀도 복합기능개발을 집중하고 개인 승용차에 대체 할 수 있는 교통수단 정비, 기존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순환 에너지 시스템 도입 등과 함께 상업업무센터 기능 강화를 통한 고용의 개선과 공공 디자인 개선 등 다양한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대중교통활성화 측면이다. 일본 토야마시(富山市)에서는 대중교통이용 촉진을 위해 편리성 향상에 따른 자동차에서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 상호의 환승 편의성 강화와 노인을 중심으로 한 운임경감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Copenhagen)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 네트워크화와 자전거이용 권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연결되도록 자전거 전용 도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자동차 도로에 병설 된 자전거 전용 도로와는 별도로, 공원, 묘지, 바다 해안이나 사용하지 않는 전차선에 자전거·보행자 전용 도로를 정비하는 그린 사이클 루트를 추진하고, 특히, 아침시간대(6: 30~12:00)에 시내 중심에서 2.2km 구간에서는 자전거 도로의 신호 대기를 없애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 측면이다. 일본 교토부의 교타나베시(京田辺市), 기즈가와시(木津川市), 세이카쵸(精華町)에서는 에너지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에너지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이를 계통 전력과 연계시키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지역의 에너지를 통괄적으로 관리하는 CEMS(Community Energy Management System) 구축, 주택의 에너지 수급을 관리하는 HEMS(Home Energy Management System) 구축, 건물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구축 등을 추진하였다. 요코하마시(横浜市)에서는 요코하마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YSCP)를 통하여 에너지 관리 시스템 및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했다. 시민, 민간 기업, 도시의 협력을 통해 스마트 시티 모델을 구축 하고 성공 모델을 국내외로 확산하는 활동이다. 특히, 다양한 지형을 가진 요코하마를 대상으로 EMS(에너지 관리 시스템)를 계층적으로 묶고 전체 시스템 수요 (전기 소비자) 측면에서 에너지 수요 관리를 실시하였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도 암스테르담 스마트 시티 (ASC)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삶” 을 목표로 주택에 스마트 미터를 도입하여 전력 소비량을 "가시화"하여 시민의 환경 의식을 고양하고 전력소비에 있어 시민행동변화를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을 목표로 조명·냉난방·보안기능을 에너지 효율과 수요관리를 높인 스마트 빌딩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지속 가능한 교통”을 목표로 상업용 선박·하천용 바지선이 정박 중에는 송전망에 연결하여 충전하도록 하고, 전기 자동차의 보급, 충전 포인트의 확충도 실시하도록 하였다.
네 번째로는 녹지의 보전과 확충 측면이다. 일본 가나자와시(金沢市)는 산림정비에 의한 이산화탄소 흡수원 대책으로 지역민 모두가 참여하는 도시숲 재생사업을 위한 환경보전협정과 고향의 숲 만들기 협정, 숲 가꾸기 지원 뱅크, CO2 흡수량 인증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열섬 현상의 완화를 위한 경사면 녹지 등을 통한 마을의 녹색 시가지 조성과 마을 안으로 흐르는 물을 이용한 도심 열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BAF (Biotope Area Factor)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부지의 녹지 비율을 정하는 제도로서 1980 년대에 도시 중심부 과밀 해결책으로 도입되어 현재 베를린 시내 전체 12곳 중 6곳에서 실시하고 있다. 목표 BAF 값은 시설의 용도(주거, 상업, 학교 시설 등)에 따라 0.3~0.6으로 정해져있고, 부지의 BAF값은 다양한 토지이용형태에 따라 0~1.0의 계수가 상세하게 정해져있다. 예를 들면 콘크리트 부지 경우의 계수는 0, 옥상녹화 또는 벽면 녹화가 되어있는 경우 높은 값의 계수 (0.7 또는 0.8)가 적용된다. 따라서 부지의 BAF 값을 구하고, 목표 BAF 값에 부족한 부분은 녹지피복영역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 측면이다. 일본 혼조시(本庄市,)는 주거지역에서 주거용지를 대상으로 태양광 패널, 지열 이용 난방 축전지, 스마트 미터 설치, 스마트 하우스 건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열은 공통의 도시기반시설을 지하에 설치하여 개별 건축을 연계하여 상호간에 사용한다. 상업지역에서는 수소 스테이션 급속 충전 시스템을 설치하였다. 태양광 패널, 연료 전지를 통해 전기 자동차와 연료 전지 자동차 모두에 연료를 공급고 있다. 업무용지는 운영센터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에너지 절약을 운용 면에서 실시하고 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는 도시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 시설과 축구장, 호텔 등 관광 · 레저 시설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1만명 규모의 단지에는 지역난방시스템 도입, 폐기물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이용하여 2만명 분의 전력을 생산하는 등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역차원의 대응방안을 살펴보면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는 지역 활성화를 염두에 둔 기후변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대대책은 단순히 국제협약이라는 규제측면에서의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이 목표가 아니라, 지자체, NGO · NPO, 시민 등 지역의 주체가 온실 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정책 및 활동을 통해서 지역의 고용 창출과 시민활동의 활성화 등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을 의도하면서 노력을 하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예를 들면, 지역에 존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책을 실시함으로써 고용과 새로운 사업체를 창출하고 기존 사업체의 매출이 오르는 등 지역의 상업, 농림 어업, 공업, 관광 등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시민, NPO, 행정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 연계한 기후변화 대책을 실시하는 것으로, 지역의 각종 단체, NPO 등의 설립을 촉진하고 활동이 활발해짐과 동시에 행정의 개혁과 지역의 사람과 사람 또는 조직 간의 관계 등의 사회적 자본이 강화로까지 연계될 수 있다. 지역차원의 기후변화 대책을 단순히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 대책이 지역 활성화와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하는 것이 이 복잡한 기후변화 대책을 지역경제 및 사회 활성화의 새로운 수단으로 받아들이면 규제가 아닌 지역을 살리는 새로운 성장 동력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